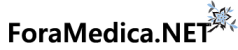일교차가 심해진 뒤로 콧물병이 오래 가요. 비염인가요?
요즘 날씨(2025년 9월 기준)는 참으로 종잡을 수 없습니다. 습하고 무더운 날이 계속되다가 하루아침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침 강의에 여기 저기 코 푸는 소리가 들립니다. 감기처럼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비염 환자 마냥 아침, 저녁으로 화장지에 손이 갑니다.
비염일까요? 비염일까 싶어 병원에서 항히스타민제나 소염제를 처방 받아 복용해도 그 때뿐이고 별 무소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원인을 모른다 하여 특발성 비염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혈관운동성 비염(vasomotor rhinitis)이라고 규정하기도 하나, 역시 현대 의학에서는 딱 부러지는 치료법이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옛사람도 이러한 일을 많이 겪어서인지 한의학에는 정말 다양한 처치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년도처럼 갑자기 찬 기운에 노출되어 생기는 콧물, 코막힘, 재채기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다만, 딱히 현대 의학에서의 병명이 마땅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콧물병’이라고만 지칭하겠습니다.
소회향(小茴香) Foeniculi Fructus
미나리과(Apiaceae)에 속한 여러해살이풀인 회향(茴香)의 열매를 ‘소회향(小茴香)’이라 한다. 한편, 약용으로 자주 쓰이던 소회향과는 달리 식용에 더 쓰이는 팔각회향의 열매를 ‘대회향(大茴香)’이라 하여 구분한다. 소회향은 주로 ‘산기(疝氣)’로 대표되는 복부 동통에 쓰인 예가 아주 많다. 그 외에도 삐끗하여 얻은 요통이나 부종, 소변불리 등에도 응용되었다. 그 작용 기전에 대해서는 본문의 《本經逢原》원문을 참고한다. 현대에는 내복약 외의 활용도 두드러진 편인데, 이 약에서 추출한 정유를 ‘모기기피제’ 원료로의 활용이 대표적이다.
정향(丁香) Syzygii Alabastrum
정향나무과(Myrtaceae)에 속한 정향나무의 꽃봉오리를 ‘정향(丁香)’이라 하여 약용한다. 원산지는 인도네시아로 기원전 3세기 경에 중국으로 유입되어 향신료로 쓰이다가 점차 약용으로의 전환이 이뤄졌다. 소화기계의 기능이 약화되어 생긴 구역질이나 복통, 설사 등에 응용하였다. 또한,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광물약물이 다수이고 가격이 높은 처방에 포함된 예도 보인다. 항균, 항바이러스 효능이 좋아서 각종 옹종에 외용제로 쓰였을뿐만 아니라, 옷이 좀을 먹지 않도록 처리할 때도 쓰였다.
필발(蓽撥) Piperis Longi Infructescentia
후추과(Piperaceace)에 속한 필발(蓽撥, 蓽茇)의 열매이삭을 향신료이자 약물로 사용한다. 인도차이나 반도가 원산지이지만 현재는 인도나 중국 등의 인근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후추과 식물의 열매가 지닌 얼얼하게 만드는 마비감을 이용하여 복통이나 치통 등에 응용하였다. 특히, 소화기계의 적체로 인한 복통, 설사, 창만감 등에 응용하였는데, 다른 후추과 기원 약물에 비해 설사에 더 자주 응용된 것으로 회자된다. 간혹 기침에 응용된 예가 있는데, 이는 화담지해의 효능이라기 보다는 식도와 그 주위의 자극에 대한 반응을 둔화시키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필징가(蓽澄茄) Cubebae Fructus
후추과(Piepraceae)에 속한 큐베브의 열매를 ‘필징가(蓽澄茄)’라 한다. 《本草綱目》이나《濟衆新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꽤 오랫동안 후추와 혼동한 약물이다. 약물의 응용도 후추와 비슷하게 주로 소화기계의 적체로 인한 복통이나 창만감, 설사 등에 사용된 예가 많다. 다만, 중국에서는 녹나무과(Lauraceae)에 속한 산계초(山鷄椒)의 열매가 이를 대체하기도 하였다. 이 약을 오수유와 배합하여 ‘산기(疝氣)’에 응용한 예가 종종 있는 바와 같이 적응증이 후추와 다소 달라진 것은 기원이 다른 산계초(山鷄椒)의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