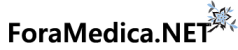A형 독감과 복서(伏暑)
2025년 11월,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 강의실에는 여기 저기 기침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증상이 심한 학생은 진료확인서를 내고 자체 휴강하기도 합니다. 한창 때인 대학생들이 끙끙 앓아눕는 판이니 그 독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2025년말)에 유행하는 독감은 대부분 인플루엔자 A형입니다. 마침(?) 연구실 학생 한 명이 그 급성기의 증상을 고스란히 겪고 회복 중인데 가래와 기침이 낫질 않는다며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차근차근 분석해주고 처방을 내주었는데 하루 정도 복용하고 확연하게 좋아졌습니다.
이 학생의 증상을 분석하여 고열이 나는 급성기와 열은 없거나 미약하고 기침과 가래가 주인 완해기로 나누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증상을 기술하고 그 증상을 한의학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하는지도 서술하였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진 뒤로 콧물병이 오래 가요. 비염인가요?
요즘 날씨(2025년 9월 기준)는 참으로 종잡을 수 없습니다. 습하고 무더운 날이 계속되다가 하루아침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침 강의에 여기 저기 코 푸는 소리가 들립니다. 감기처럼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비염 환자 마냥 아침, 저녁으로 화장지에 손이 갑니다.
비염일까요? 비염일까 싶어 병원에서 항히스타민제나 소염제를 처방 받아 복용해도 그 때뿐이고 별 무소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원인을 모른다 하여 특발성 비염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혈관운동성 비염(vasomotor rhinitis)이라고 규정하기도 하나, 역시 현대 의학에서는 딱 부러지는 치료법이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옛사람도 이러한 일을 많이 겪어서인지 한의학에는 정말 다양한 처치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년도처럼 갑자기 찬 기운에 노출되어 생기는 콧물, 코막힘, 재채기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다만, 딱히 현대 의학에서의 병명이 마땅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콧물병’이라고만 지칭하겠습니다.
머리에는 이상이 없다는데 말이 어눌해졌어요.
병원에서 CT나 MRI, MRA를 찍고 온갖 검사를 다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어눌해지거나, 말을 더듬거나, 머릿속에 단어가 맴도는데 뱉어지질 않는다거나, 엉뚱한 말이 튀어나온다거나 하는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증상을 어언불리(語言不利), 언어건삽(言語蹇澁) 등으로 표현하며, 뇌신경손상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합니다. … 뇌신경에 문제가 없는데 말이 어눌해졌다면 위 네 가지가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이 원인이 되기도 하며 올바르지 못한 식생활 등의 자신도 잊고 있었던 다른 이유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옛사람은 혀(舌)는 마음(心)이 부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올곧은 상태를 방해하는 요인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 치료의 지름길입니다.
삼차신경통과 위풍증(胃風證), 그 두 번째 의안.
첫 번째 의안(醫案)에서는 두면부의 울혈이 원인인 삼차신경통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대상포진바이러스가 원인인 삼차신경통의 사례입니다.
앞의 의안에서 언급하였듯 한의학에서는 삼차신경통을 ‘위풍증(胃風證)’으로 분류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풍열독기(風熱毒氣)로 인한 위풍증 증상을 ‘어떤 사람이 코와 관자놀이가 아프거나 마비되어 감각이 없기도 하며, 귀밑머리와 광대뼈부터 입술과 잇몸까지 붓고 아파서 입을 벌릴 수 없고, 이마와 광대뼈에 늘 풀을 발라 놓은 것처럼 당기고 손이 닿기만 해도 아파한다.’라고 이전 의서의 상세한 묘사를 인용해 두었습니다. 여기에서의 풍열독기(風熱毒氣)란 운동 또는 감각기능 이상이 있다는 점에서 풍(風), 화끈거리거나 붉어지는 등의 열적인 증상이 있으므로 열(熱), 그 증상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하다는 의미에서 독(毒), 어떠한 기운이 영향을 끼쳤다는 의미에서 기(氣)라는 의미입니다. 단, ‘어떠한 기운’은 외부와 내부, 둘 모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한의학에서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통증이 극심하다면 풍열독기(風熱毒氣)라 칭하기도 합니다. 치료의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삼차신경통과 위풍증(胃風證), 그 첫 번째 의안.
삼차신경병증(trigeminal neuralgia)의 주증상이 통증일 경우엔 ‘세상에서 첫째가는 통증(天下第一痛)’이나 ‘자살하고 싶은 만큼 괴로운 병(suicide disease)’이라고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위풍증(胃風證)’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에서의 위(胃)는 밥통이 아니라 얼굴에 분포하는 경근(經筋) 중 가장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양명경근(陽明經筋)을 의미하며, 이 부위에 감각/운동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는 의미로 풍(風)이라 합니다. 양의학에서는 머리를 다쳤을 때 신경이 손상되거나, 인근의 혈관이나 종양 등이 신경을 압박하거나, 바이러스가 신경절을 침범하여 발생한다고 봅니다. 한의학에서도 유사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얼굴의 부종(面腫)과 풍열독기(風熱毒氣)와 같은 감염 등을 위풍증(胃風證)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이러한 위풍증(胃風證)의 두 사례를 차례로 나누어 싣습니다.
첫 번째 의안(醫案)은 심하지 않은 삼차신경통을 오래 앓았던 분의 한방치료 결과입니다. 환자와 원장님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나이 들어 팔다리에 힘이 없어요, 위연(痿軟)
현대의 7~80대의 노인층에게는 위와 같이 身軟이 있으면서도, 위와는 다르게 몸이 마르며 힘이 떨어지는 痿弱이 동시에 나타나는 ‘위연(痿軟)’이 더 흔합니다. 더욱이 이 ‘痿軟’은 위의 예시보다 치료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위 환자는 몸이 마르지는 않았으므로 痿軟이라 하기는 약간의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나 痿軟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표성을 감안하여 글 제목을 ‘나이 들어 팔 다리에 힘이 없어요, 위연(痿軟)’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痿軟’이 과거와는 그 원인과 양상이 약간 다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필수적인 영양 섭취 문제가 크지 않은 시대인 만큼, 宗筋이 허약해진 원인은 대사기능의 이상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욕과 소화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陰液의 부족이나 순환 이상을 야기하는 기저질환이 있을 때 痿軟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과거처럼 무작정 補益만을 해서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처방하여야 합니다.